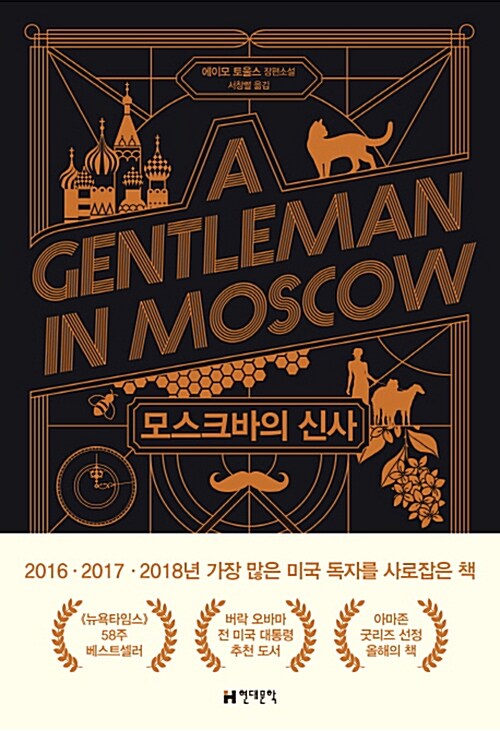올해는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보다, 사두고 읽지 않은 책을 읽으려고 한다. 소위 벽돌책과 준고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은데, 천천히 읽고 있다. 언제 어떤 이유에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잡히는 책 모두가 좋다. 「속죄」도 좋았는데, 재미로 치자면 당분간 「모스크바의 신사」를 따를만한 작품은 없을 것 같다. 고전이 대개 50페이지 정도는 넘어가야 이야기에 몰입이 되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재밌다. 이야기의 설정과 배경,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와 위트있는 문체,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 로스토프의 전체적인 풍모 때문에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니나 다를까 2024년에 이완 맥그리거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제작되었다. 아쉽게도 OTT 플랫폼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다. 아쉽다.
때로 '재미있다'는 말이 작품을 폄하하는 것 처럼 쓰일 때가 있다. 너무 얄팍한 감상의 태도로 비춰질 때도 있다. 누군가 그 책 재미있니? 라고 물으면 재미있다고 말한 다음 뭔가 의미있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야 할 것은 부담을 가질 때가 있다. '재미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이다. '재미있어'라는 한 마디로는 책 전체를 설명하기도 부족하고, 더구나 내가 그 책을 잘 읽은 것이 맞나? 뭔가 놓친 것은 없나? 이런 자기검열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이 책을 재미있다고 말할 때는 이런 우물쭈물 하는 마음이 없다. It's just interesting.
「모스크바의 신사」의 재미는 단연, 주인공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의 인간적인 매력에서 나온다. 볼세비키 혁명이후 구시대의 귀족인 로스토프 백작은 평생 메트로폴 호텔에 연금되어 호텔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게 된다. 나는 잠깐 '호텔'이라는 화려하고 편리한 환경이 '연금'이라는 구속 상태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러시아에서 가장 귀족적이고 우아한 호텔에서라면 평생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선고를 받을 당시 로스토프는 30대 초반이다. 그로부터 30년 넘는 세월을 로스토프 백작은 메트로폴 호텔에서 지낸다. 메트로폴 호텔이 온 삶의 공간이 된 셈이다. 그러나 '니나'와의 만남으로 로스토프 백작에게 메트로폴 호텔은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의 의미를 넘어선다.
"니나가 호텔에 있는 동안 벽은 안으로 좁혀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영역과 복잡성이 모두 확대되면서 밖으로 팽창했다. 니나가 이곳에 온 지 첫 주가 지났을 때 호텔은 두 구역의 삶을 포괄할 정도로 팽창했다. 첫 달이 지났을 때는 모스크바의 절반을 아우를 정도로 팽창했다. 만약 니나가 이 호텔에서 충분히 오래 지낸다면 호텔은 러시아 전체가 될 것이다.(94)"
이렇게 확장된 메트로폴 호텔에서 로스토프 백작은 "어떤 상황에 내몰리는 것과 상황을 잘 감수해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338)는 것을 생각하며 품위있는 삶을 산다. 로스토프 백작의 품위는 학습으로 습득된 것이라기 보다 타고 난 것에 가깝다.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으로 자라고, 귀족으로 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사인 사람. 거기에 타고난 낙천성과 유머를 겸비한 사람. 소설 속 인물이 이렇게 완벽해도 되나. 인간의 심층을 탐구하려면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나 미완의 성질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 작품에 의미없는 물음들이다. 작가는 로스토프를 통해서 완벽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이란 무릇 "환경에 지배당하기 보다 환경을 지배해야"(35)한다는 신념을 가택 연금된 상황에 처한 한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수 있겠다. 마치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처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물론 빅터 프랭클보다 로스토프는 훨씬 더 윤이 난다. "직업을 갖는 것은 신사의 일이 아니며 식사와 토론, 독서와 사색, 일상적인 잡다한 일들과 시를 쓰는 것"(14)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니까 말이다. 르네상스 인간의 전형.
이 작품에서 인간의 품위는 로스토프 백작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주방장 에밀과 지배인 안드레이, 재봉사 마리아, 바텐더 아우드리우스, 공산당 관료 오시카 그리고 그의 친구 미시카와 안나와 소피아. 등장인물 대부분 모두가 자존심을 지키고 품위있게 행동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다는 점이다.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디테일에 강하다. 그들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로 부터 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를 잘 다듬고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로스토프 백작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로스토프 백작은 이런 사(진)실을 소피아를 떠나보내면서 말해준다.
돌이켜보면 역사의 모든 전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지만 그 말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람은 예술이나 상업, 또는 사고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갈림길마다 매번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들이야. 마치 '삶'이란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때때로 그들을 불러낸 것 처럼 말이지.(656)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뜻하지 않게 이 책이 교훈적인 것 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내 오랜 습성일뿐, 말했듯이 「모스크바 백작」은 재미있는 책이다.
그나저나 로스토프 백작이 신사의 조건이라고 말한 바를 다 갖추고 있는 지금의 나는, 품위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